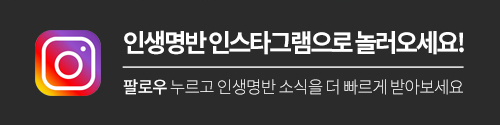인생명반 에세이 50: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My Bloody Valentine) - m b v
굉음으로 빚어낸 두 번째 세계
■ 신발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고독한 음악
오랫동안 슈게이징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잘 쓸 수가 없었다. 단순히 난해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 슈게이징이라는 게, 해석을 거부하는 음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My Bloody Valentine)”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언젠가 이들의 음악이 꼭 내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술은 고독한 것이라 누군가 말했던가. 그중에서도 슈게이징이란 고독을 적극적으로 전시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은 그중에서도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팀이라 봐야겠다. 어떤 면에서 있어서 그들은 고독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원래 잔뜩 일그러진 소리로 청자를 자극하는 것이 록 음악의 미학 아니던가, 소음의 미학, 굉음의 예술, 그것이 록이라 할 수 있는데, 슈게이징은 원래부터 잔뜩 일그러져 있던 굉음을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훨씬 더 일그러뜨려버린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청자가 듣기에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채기도 힘들 만큼 말이다. 그런 음악에 정점에 선 이들이 바로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다. 이게 고독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음악은 남들을 향해 분노를 내뿜지도 않는다. 마음에 분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분노를 그저 자기 안에서만 끓이고 싶은 것 같다. 남들을 향해 분노를 내뿜는 것마저도 지쳐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자꾸 자기 내면으로 숨고 싶어지는 거다. 이들이 내뿜는 굉음들은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분노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왜냐면, 내가 내 속으로 가장 깊이 침투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떠오른 음악이 이들의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 예술의 역설
예술을 만드는 과정은 고독할지라도, 예술을 남들 앞에 전시하는 것은 고독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그래서 예술은 모순과 역설의 연속이다. 예술이란 본디 고독 속에 피어나는 꽃인데, 그 꽃은 남에게 전시되기 위해 피어났으니.
훌륭한 예술일수록 고독 속에서 피어났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왜 그럴까. 왜 예술은 반드시 남 앞에서 전시될 운명을 타고 났으면서도, 이런 역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예술의 참된 가치는, 예술이 아니고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있다. 누군가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말도 가끔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사람과 예술을 분리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타인을 마주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 지속될수록, 예술만이 가지는 가치를 내면에서 발견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예술 창작을 위해선 고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남들 앞에 표현하기 힘든 것이며, 무엇이 예술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가치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을 느낀다는 건 뭘까. 고독이란 남들로부터 홀로 떨어진 상태를 인식하는 데에서 온다. 예술의 역설은 바로, 이런 고독의 타고난 성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남들과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더라도,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도 포함된다. 이토록 고독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함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고독도 느낄 수 있는 거다.
■ 난해한 예술은 가치 없는 예술인가
난해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고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 내뿜는 소리들은, 지독한 고독의 굉음이며, 그것을 애써 전시하는 것은 그 고독만큼이나 지독한 발버둥인 것이다. 고독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발버둥.
사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는 삶 자체를 저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삶의 기쁨이란 으레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이런 삶의 기쁨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창작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쁨을 얻는 게 남들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이 흔히 예술가가 된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작품들 중에는, 평소 예술을 깊게 탐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다. 아니, 예술을 깊게 탐구해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난해한 것도 존재한다. 그런데, 흔히 난해하다 불리지만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는다. 난해한 만큼 좋아해줄 사람도 적을 텐데,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타인의 마음에 와 닿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괴이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술 작품에 감명을 받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작품에 감명을 받을까. 역시, 남들이 잘 건드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을 예술이 건드리기 때문이리라. 남들에게 쉬이 말할 수 없었던 열망이나 사연, 감정 등을 예술이 대신 표현해주었기 때문이리라.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리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풍경을 그 작품이, 그 예술가가 대신 표현을 해주었는데, 남들이 난해하다느니 뭐라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다. 내게는 동화책처럼 쉬우니까. 어쩌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나만 이해하는 기분이 들어, 나만의 보물을 갖게 되는 기분마저 든다. 그리고 어쩌다 귀하게도 이런 작품의 맛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 속 보물을 조심스레 꺼내서 보여주는 기분도 들고. 그렇게 난해하다 불리는 작품이,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다.
■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내 마음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 정규 2집 앨범 “Loveless”를 1991년에 발표하고, 10년이 넘도록 새 앨범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2013년, 무려 약 22년 만에 정규 3집 “m b v”를 발표하며 팬들을 경악시켰다. 2집 앨범에서도 그토록 일그러진 굉음을 내뿜으며, 지독할 만큼 내면에 깊이 침투하던 그들이었다. 밴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멤버 케빈 쉴즈(Kevin Shields)는 2집 이후 반드시 새 앨범을 낼 거라고 간헐적으로 얘기하고는 했는데, 늘 영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미루다가 22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앨범을 처음 들어보면, 사실 이런 걸 위해서 22년 가까운 세월을 바쳤나 싶을 정도로 얌전한 분위기를 깔고 들어간다. 그런데 듣다 보면, 그 얌전함 속으로 침투하게 되면서, 어느새 전에 있던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모습은 잊게 된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새로운 앨범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새로운 밴드가 첫 앨범을 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와중에 언뜻 드러나는 전 앨범의 흔적이 반갑다가도, 어느새 그것마저도 고요한 새로움 속에 삼켜지는 느낌.
앨범을 듣다보면 내면으로 지독하게 침투하게 되지만, 그런 음악적 속성과는 달리, 가사나 제목에서 “You”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 “You”라는 단어를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지만, 나는 왠지 자신의 내면에 발견을 또 다른 나를 만난 것처럼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만큼 기이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은가. 나의 내면에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분노를 느낄 때, 그 때 느껴지는 당혹스러움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창작의 고통은 무겁고 창작물을 밖으로 꺼내는 건 더욱 그러하다
케빈 쉴즈의 성격은 그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을 통해서 내놓는 음악들을 무척이나 닮았다. 그는 공연 도중에도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객들을 배려하지도 않은 채, 반이나 연주한 곡을 갑자기 중단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괴벽을 발휘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인과의 타협을 철저히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게 설령 자신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런 케빈 쉴즈마저도 예술 작품은 타인에게 전시되기 위해 만들어지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있었는지, 이 앨범에서 그 깨달음에 대한 표현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내면으로 침잠할수록 내 안에 “You”를 많이 만나게 되면서, 나의 내면은 어쩌면 외부세계에서 만난 수많은 “You”들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나의 내면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바깥과의 만남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케빈 쉴즈에겐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앨범의 마지막 세 트랙이 보여주는 격정성은 의미하는 바가 깊어 보인다. 이 앨범은 전 앨범에 비해 전체적으로 얌전한 사운드를 들려줌에도, 마지막 세 트랙만큼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모든 커리어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처음 여섯 트랙의 일그러진 고요는 케빈 쉴즈가 새로운 앨범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는 과정, 그 고뇌와 함께 더욱 철저히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 같다. 반면, 마지막 세 트랙은 이런 고뇌들을 모두 깨부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 두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창작을 위한 고립의 시간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다시 밖으로 나서는 일 또한 날이 갈수록 어렵고 고단해졌을 것이다. 그런 세월을 증명하듯, 마지막 세 트랙은 가장 어지러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다. 어지러운 만큼 누군가에겐 난해하게 들리기도 할 것이다. 7번 트랙 “In Another Way”는 이제는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과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엎치락뒤치락 섞이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지며, 특히 3분 34초 동안 한 구간만 지독하게 반복하는 8번 트랙 “Nothing Is”에서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깨부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어지러운 마음을 겪으며 두려움을 깨부수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렵다. 밖은 오랫동안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을 때와 별반 다름없이 여전히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어지러움을 그대로 안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자기 안에 고립되어 갈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예술가의 숙명처럼. 사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예술가뿐이랴,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은 타인을 전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바깥이 두렵게 느껴지는, 온전한 고립의 상태를 갈망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밖으로 나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이란 때론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으니까.
바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바깥이 무섭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만 고립되어 살아갈 수는 없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나 자신이 파멸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밖으로 나와야만 했던 것이다. 밖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바뀐 건 나 자신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안은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내가 바뀌자, 세상도 바뀌었다. 세상이 정말로 크게 바뀐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이 달리 느껴지기 시작한 거다. 세상은 이 앨범의 9번 트랙 “Wonder 2”라는 제목처럼, 나의 두 번째 놀라움이 된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오랫동안 내 안에 갇혀 있던 오랜 고립의 시간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으나, 고립의 시간 동안 쌓인 나의 사유와 고찰들은 내가 세상을 달리 보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의 고립의 시간들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겠지. 두려움이란 반드시 이겨낼 필요가 없는 거다. 나는 계속 이렇게 두려움을 안은 채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너무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두려움 덕분에 당분간 고립의 시간을 다시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트랙리스트
1. She Found Now
2. Only Tomorrow
3. Who Sees You
4. Is This and Yes
5. If I Am
6. New You
7. In Another Way
8. Nothing Is
9. Wonder 2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 슈게이징(Shoegazing) 추천 명반 BEST 5 - 락 서브장르 탐험 1
▲ 신세이카맛테짱(神聖かまってちゃん, Shinsei Kamattechan) - つまんね(시시해)
▲ 바디헤드(Body/Head) - The Switch